
베일러와 스미스가 제기한 불편한 질문
1986년, 미국의 역학자 존 베일러(John Bailar)와 통계학자 일레인 스미스(Elaine Smith)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암 치료의 성과를 되짚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간결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35년에 걸친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 논문은 의학계 전체를 뒤흔든 문제제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암과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와 제약업계, 학계가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죽음’이라는 근본 지표 앞에서는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율을 믿지 마라: 왜 5년 생존율은 착시인가
일반인들은 암의 치료법을 평가할 때, 5년 생존률을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생존기간이나 생존률이 아니라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암 5년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통계를 듣습니다. 하지만 베일러는 이 지표 자체가 심각한 편향을 내포한다고 말합니다.
가상의 예를 보겠습니다:
- A마을과 B마을은 암 사망률이 동일하며, 평균 진단 연령은 70세, 사망은 80세입니다.
- 그런데 A마을에 정밀 조기진단법인 '프리벤틴 검사'가 도입되어 암이 60세에 발견됩니다.
- 암검사로 암을 발견했지만 치료법은 없으므로 A, B 두 마음의 환자는 여전히 80세에 사망합니다.
이 경우 A마을의 환자는 진단 후 20년을 살고, B마을은 10년을 삽니다. 즉, 생존율은 높아지지만 생명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진단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존율 착시(survival bias)'입니다.
암 사망률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베일러와 스미스는 아예 지표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암 생존율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왜 연령표준화가 중요할까요?
- 미국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 암은 고령자에게서 더 흔하므로, 단순한 '사망률 원자료(raw death rate)'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62년부터 1985년까지의 암 사망 데이터를 1980년의 인구 구조로 보정했습니다. 즉, 매년의 사망률을 같은 연령 분포로 정규화하여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 사망률은 8.7% 증가했다.
무엇이 이 수치를 설명하는가?
비관론자들은 흡연율 증가, 특히 폐암의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화학요법이 복잡하고, 많은 의사들이 최대 용량 치료를 꺼리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치료가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줄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이유로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조건부 실패라는 선언
베일러와 스미스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암 치료를 통해 몇몇 희귀암에서 성과를 냈고, 삶의 질을 개선했지만, 전반적으로 암 치료 전략은 '조건부 실패(qualified failure)'다."
이 선언은 단지 암 치료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의학적 성공의 정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후 베일러는 치료보다 예방과 환경 요인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암과의 전쟁에서 진짜 성과를 내려면, 조기 진단이나 치료 기술의 향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암 사망률을 낮추려면:
- 담배, 알코올, 식생활 개선 등 근본적 인자에 집중해야 하고,
- 치료 중심 패러다임에서 예방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충격과 반발: 베일러 논문이 일으킨 파동
베일러의 분석은 암 연구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NCI(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항암 산업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그를 "비관론자"나 "괴짜"로 몰았고, 주요 학술지에서는 일제히 반박 논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흔한 반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암 치료는 너무 복잡해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뿐이다.
- 많은 의사들이 최적의 복합 화학요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실제로는 특정 암에서 생존율이 향상되었고, 이득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반론조차도 "암 치료가 전반적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주장까지는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베일러는 결국, 암 사망률을 줄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통계적 사실을 들이밀었고, 누구도 그 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언론에서 "국립암연구소의 가시"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암 연구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베일러 논문이 불러온 의외의 결과: 대체의학의 부상
이 논문은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정말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학문적 문제를 넘어서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시스템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현대의학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억눌려 있던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퍼지게 되고 수십년동안 담론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 국회에서 OTA 보고서라는 것이 발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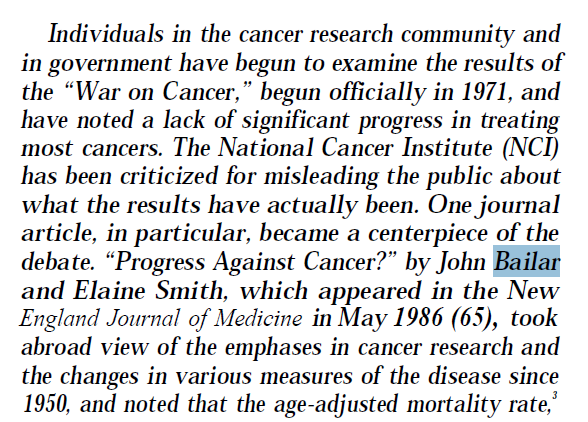
대체의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의원 특히 톰 하킨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체의학국이 설립됩니다.
- 1991년 OAM 설립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특히 아이오와의 민주당 상원의원 톰 하킨(Tom Harkin)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NIH 예산 소위원회에서 OAM 설립을 이끌며, 대체의학 연구의 공적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톰 하킨 상원의원의 영향력
그는 "대체의학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여지가 있으며, 조기 진단이나 기존 치료법이 못 미치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OAM뿐 아니라 이후 NCCAM 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톰 하킨이 대체의학에 빠지게 된 것은 면역력이 약해진 자신에게 벌화분(beepollen) 요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경험이 대체의학 발전의 출발점이자 그가 NIH 산하 대체의학 기관을 설립하게 된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하킨 상원의원은 1980년대에 만성적인 건초열(알레르기)로 고통받다가 벌화분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루 최대 60알(혹은 이와 유사한 고용량)의 벌화분 캡슐을 복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대체요법은 공화당 사람들이 좋아하고 새로운 대체의학은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톰 하킨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막상 OAM의 대체의학 연구에서 벌화분 요법은 지원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보다는, NIH의 과학적 중립과 엄격한 검증 절차를 강조한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이 과학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과학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가 바로 그러한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의 현대의학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보고서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한의사들은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현대의학이 실패했으니, 이제 자기들 차례라고 별 소리를 다했는데, 그 뒷부분의 보고서에 수 많은 대체의학 치료법이 언급되었지만, 보고서에서 치료효과가 있다고 쓰여있는 치료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이후에 OAM, 및 NCCAM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연구는 주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집중하게 되고, 아마도 제가 과문해서 인지는 몰라도 수조원을 썼지만 효과있는 치료법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반복되는 잘못된 주장
오늘날 방송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생존율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일러와 스미스는 40년 전 이미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5년 생존율을 들었을 때, 정말 더 오래 산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농담같지만, 실제로 암생존률과 사망률의 중요성을 착각해서 몇년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갑상선 암 때문입니다. 갑상선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 갑상선암 사망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즉, 엉뚱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죠.
TMI
일레인 스미스는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그녀를 추모하는 글에도 위의 논문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