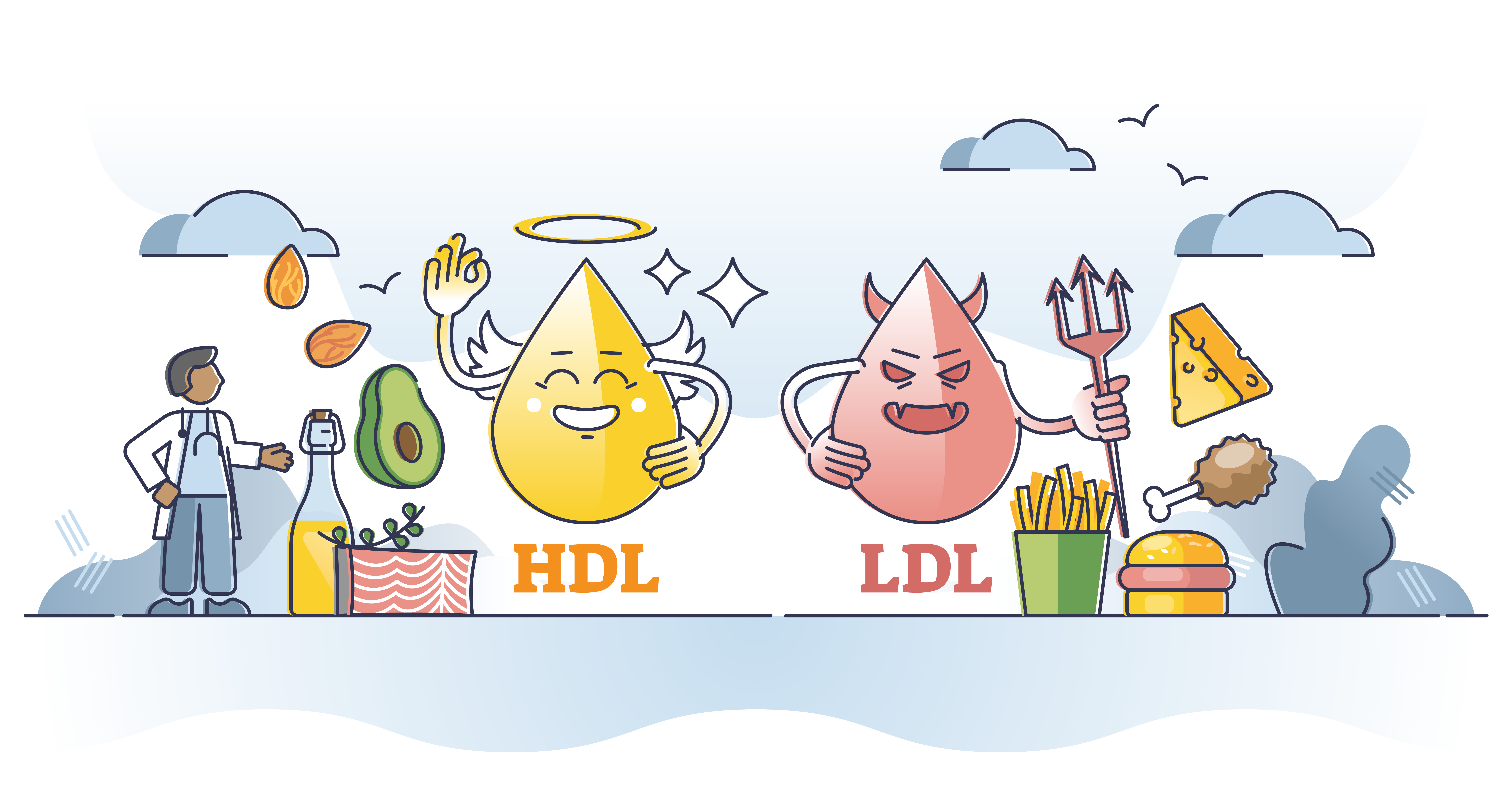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특히 포화지방산은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식단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달걀노른자, 버터, 붉은 고기 같은 음식은 기피 대상이었고, 대신 식물성 기름이나 저지방 가공식품이 건강식으로 권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1950년대 안셀 키스(Ancel Keys)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화지방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는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그의 연구는 미국과 WHO 등 주요 보건기구의 식사지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키스의 연구는 표본 국가의 선택 편향과 탄수화물 대체 효과를 무시한 점에서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포화지방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심혈관질환의 실제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차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정말 나빴던 걸까? — 다시 보기 시작한 과학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과거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규모 메타분석들이 등장합니다.
- Siri-Tarino et al., 2010,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이 연구는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한 21개의 연구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포화지방 섭취는 심혈관질환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 de Souza et al., 2015, BMJ
더 정교한 통계모델을 적용한 이 메타분석 역시,“포화지방과 심장병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PURE Study, 2017, Lancet
18개국 1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특히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아졌다”고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포화지방은 절대악”이라는 과거의 단정적 시각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포화지방은 몸에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포화지방 자체보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화지방을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으로 대체했을 때는 심혈관질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불포화지방(특히 오메가-3나 올레산 등)으로 대체했을 때는 위험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산화된 LDL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산화된 LDL(oxLDL)의 역할에 주목하게 됩니다.
LDL 그 자체는 필수적인 콜레스테롤 운반 수단이지만, 산화되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입자가 됩니다. 산화된 LDL은 면역계가 위험물질로 인식하며, 대식세포가 이를 흡수해 거품세포가 되고, 결과적으로 죽상경화의 핵심 병변이 됩니다. 즉, 심혈관질환에서 진짜 문제는 LDL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LDL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LDL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입자 내의 ‘불포화지방산’이 산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LDL 안에는 리놀레산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현대 식단에서 흔히 섭취되는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옥수수기름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특히 산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온 조리나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쉽게 과산화지질로 바뀌고, LDL 입자를 산화시켜 oxLDL로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생성된 oxLDL은 TLR4와 CD36 복합체에 의해 면역계가 인식하게 되고, 염증 반응과 죽상경화를 유도합니다.
반면,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산화에 매우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 입자의 산화 저항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산도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미트산은 직접 산화되지는 않지만 TLR4 수용체를 자극하여 NF-κB 경로를 활성화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oxLDL이라는 경로는 아니더라도, 포화지방산도 면역계를 자극해 만성염증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 심혈관질환은 포화지방 때문이라는 기존 가설은 최근 10~15년간 도전받고 있습니다.
- 메타분석 및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은 포화지방 자체의 유해성은 생각보다 낮으며,
무엇으로 대체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여줍니다. - LDL의 산화는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6 과잉에 의해 촉진되며,
이 oxLDL이 심장병과 죽상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포화지방은 oxLDL과는 거리가 있지만, TLR4 자극을 통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심혈관질환의 또 다른 경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포화지방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어떤 지방을,
- 얼마나,
- 어떤 환경(항산화/산화스트레스 등)에서,
- 어떤 식단 구조와 함께 먹느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의 단순한 ‘지방=나쁨’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방=몸에 좋다’로 쉽게 치환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균형과 맥락, 그리고 지방이 면역과 대사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를 결정할 때 의외로 면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음식을 단순히 좋고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 지방이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